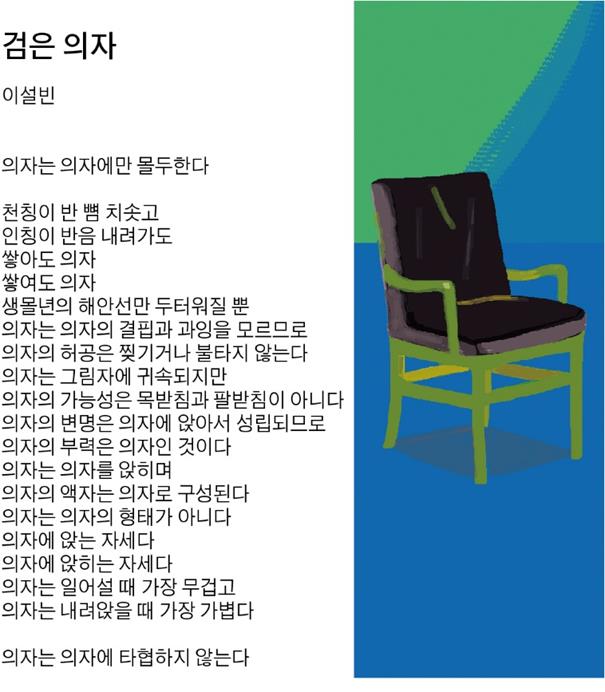
뒤척이는 일들이 생길 때 저는 제가 하루의 여러 시간을 보내는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해요. 그러면 그림자가 비로소 몸을 만나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물음표가 생길 때는 텅 빈 시간대의 카페에 가요. 가득한 의자들을 보고 있으면 실마리가 풀릴 때가 있어요. 이 시를 읽고 알게 되었어요. 의자는 형태가 아니라 자세여서 그랬다는 것을요.
의자의 가능성은 목받침과 팔받침이 아니지요. 의자는 기능적 도구가 아닌 자세의 발명이니까요. 의자는 부력과 액자를 내부에 갖고 있지요. 결핍과 과잉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 의자의 윤리예요. 그것을 탐하는 순간 의자는 의자가 아닌 것으로 변질되거든요. 의자는 의자를 벗어나서는 성립되지 않는, 명확한 딜레마가 자신의 가능성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듯해요.
의자 밖에 못 가지는, 안 가지는 세계인 의자는, 인간에게 이상적인 자세를 늘 알려주는데, 인간의 자세는 자주 무너지지요. 의자를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일어서려면 의자의 자세를 전면적으로 무너뜨려야 하니 가장 무거운 자세겠지만, 내부가 품고 있는 능동의 부력이 작동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자세의 발명일 수 있지요.
몰두하면 하나 둘 사라져 간다네. 의자에게는 의자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네. 오롯한 순간이라네. 몰두는 의자와 헤어지지 않는 순간이 계속되게 한다네. 몰두와 타협은 서로를 구분하기 때문이라네. 의자는 결코 의자에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의자는 의자와 타협하지 않을 때만 의자로 겨우 존재한다네. 이것이, 어찌 보면 고통의 퍼레이드이고 어찌 보면 몰두의 놀이인, 우리 의자의 삶이라네.
잠기면서 출렁이면서 생몰년의 해안선을 감당하면서, 검은 의자는 이렇게 설(說)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안의 스승처럼.
이원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