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싱어 '우리 시대의 동물 해방'
수 도널드슨·윌 킴리카 '주폴리스'
김다은·정윤영·신선영 '동물의 자리'

몸 크기에 딱 맞는 철제 우리(스톨)에 갇혀 사육되고 있는 어미 돼지의 모습. 어미 돼지는 스톨에 평생 갇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2018년 2월 산양 28명(사람을 세는 단위 '名'이 아닌 생명을 뜻하는 '命')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간 동물'(이하 인간)을 후견인으로 내세워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을 위협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막기 위해서였다. 2003년엔 도롱뇽이, 2007년엔 황금박쥐·수달·고니 등 '비인간 동물'(이하 동물) 7종이, 2010년엔 검은머리물떼새가 환경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동물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가진 존재'쯤으로만 여겨졌던 동물이 법치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권리를 주장한 일대 사건이었다.
동물권, 동물 복지, 비건 등은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 1975년 출간된 이후의 극적인 변화다. 공장식 축산과 동물 실험을 직격한 이 책 이후 동물권 운동은 크게 진전했다. 그럼에도 '인간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뿌리 깊다. 싱어는 "실천적 측면에서 따져볼 때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우리 태도는 거의 변한 게 없다"며 "그들의 이익은 인간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을 때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는다. 최근 펴낸 '동물 해방'의 전면 개정판 '우리 시대의 동물 해방'에서 지난 수십 년간 동물권 운동이 이룬 진전과 퇴보를 함께 짚으면서다. 그러면서 역설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목격한 것보다 훨씬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리 시대의 동물 해방·피터 싱어 지음·김성한 옮김·연암서가 발행·456쪽·2만5,000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동료 시민'이다"
그 급진적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잇따라 찾아왔다. 캐나다의 동물권 활동가 수 도널드슨과 정치 이론가 윌 킴리카가 쓴 책 '주폴리스', 사회학자 정윤영과 현직 기자 김다은의 '동물의 자리'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책이다.
'주폴리스'는 동물을 의미하는 주(zoo)와 도시 공동체를 뜻하는 폴리스(polis)를 합친 말이다. 도시계획학자 제니퍼 월치가 처음 고안한, 동물을 고려하는 '동물도시' 개념에다 정치적 맥락을 덧입힌 게 '주폴리스'다. 인간과 동물의 동물정치공동체.

주폴리스·수 도널드슨 윌 킴리카 지음·박창희 옮김·프레스 탁! 발행·544쪽·2만8,000원
'주폴리스'는 시작부터 동물권 운동의 한계를 들춘다. 몇몇 작은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 감소를 목표로 한 동물복지론적 접근은 "전략적 실패"라고 규정하면서다. 앞선 책에서 싱어는 지금도 "매년 830억 마리의 포유류와 조류가 (평생 열악한 축사에 갇힌 채) 식용으로 사육돼 도살당한다"며 "이들과,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수십 년간 고통받다 죽어갈 다른 모든 동물을 위해 '우리 시대의 동물 해방'을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주폴리스'는 죽거나 고통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동물 권리를 주장한다. 인간에게 동물의 서식지를 존중할 의무, 인간의 활동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본 동물을 구조할 의무, 인간에게 의존하게 된 동물을 돌볼 의무 등을 지우면서다. "우리는 동물과 함께 사는 공유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책은 야생 동물과 사육 동물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소외된 '경계 동물'도 본격 조명한다. 이를 테면 길고양이. 인간이 주는 먹이나 음식쓰레기에 의존해 살아가지만 완전히 인간에게 길들여지지도 않은 존재다.
동물 문제를 도덕의 문제에서 정치의 문제로 판을 바꿔버리면서 다소 급진적 주장도 펼쳐진다. '주폴리스'는 경계 동물을 이주민에 빗대고 인간과 주거지를 공유하며 살 수 있도록 주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육 동물에게는 시민권을, 그들만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둬야 할 야생 동물에게는 주권을 줘야 한다고 역설한다. 최명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교수는 '감수의 글'에서 "서구 자유주의 개인 주체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시민권 개념을 동물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면서도 "책은 최근 한국 사회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폭발에 유용하게 접속한다"고 밝혔다.

동물의 자리·김다은 정윤영 글·신선영 사진·돌고래 발행·352쪽·2만2,000원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주폴리스'가 앞으로 나아갈 동물권 운동의 이론적 틀과 방향을 제시한다면 '동물의 자리'는 그 실천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물의 자리' 저자들은 '먹히지 않고 늙어가는 동물'들의 보금자리인 생추어리(안식처, 보호구역이라는 뜻) 4곳을 찾아 글과 사진으로 남겼다. 2019년 한 종돈장에서 구조돼 고기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돼지가 사는 국내 최초의 '새벽이생추어리'부터 야생동물로 태어났지만 웅담 채취를 위해 인간 손에서 길러진 사육곰이 여생을 보내는 '강원 화천 곰 보금자리', 불법 축사에서 구출한 소들의 안식처인 '강원 인제 꽃풀소 달뜨는 보금자리', 결국 도축될 운명이었던 퇴역 경주마의 생추어리인 '제주 곶자왈 말 보호센터 마레숲'까지.
설립 배경과 목표는 모두 다르지만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인간과 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다. "생추어리는 인간에 의해 손상된 동물의 삶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킬지, 얼마나 되돌려줄 수 있을지를 우리 사회를 향해 묻는다."
특히 신선영 작가가 동물들과 눈 맞추며 찍은 수십 장의 책 속 사진들은 울림이 있다. "언젠가 생추어리 동물들이 '최고령 동물'이 됐을 때 다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들과 함께 늙어가는 존재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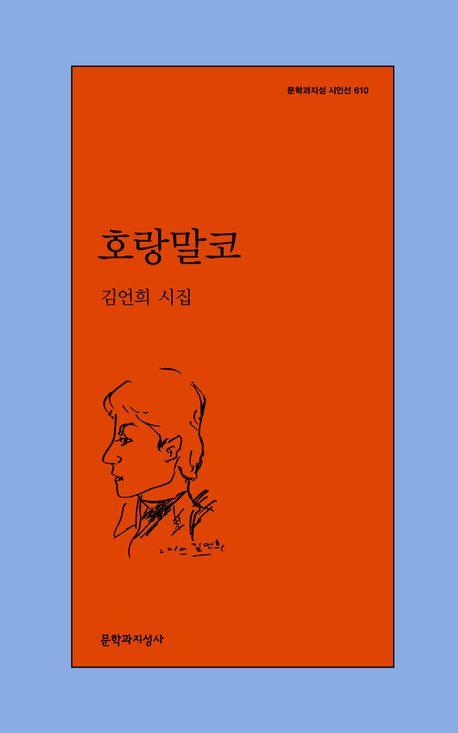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