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기후 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뉴스1
국내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아시아 최초란 의의가 있지만, 본격 심리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기후소송 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길 바란다.
어제 헌재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 불충분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정책에 위헌 요소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 등이 미흡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시작됐고, 이후 영유아의 부모 등 세 건의 기후소송이 더해졌다. 그사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30년까지 24.4%(2017년 대비)에서 40%(2018년 대비)로 상향되긴 했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연평균 감축 목표는 1.9%에 불과하고, 2028~2030년 각 9.3%씩 감축하겠다고 미뤄놓은 상태라 실현 의지도 의문이다. 직접 감축 대신 해외 조림(造林), 탄소포집 저장·활용(CCUS)과 같은 불확실한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꺼리기 마련이다. 탄소감축 노력도 행정부의 소관이 맞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면 적극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세계 10위인데, 기후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에 불과하다.
헌재에 어떤 식의 결론을 내라고 압박할 순 없는 일이다. 그러나 2013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미국 몬태나주,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는 사례가 쌓이면서, 각국의 미흡한 탄소감축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헌재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신속성도 잃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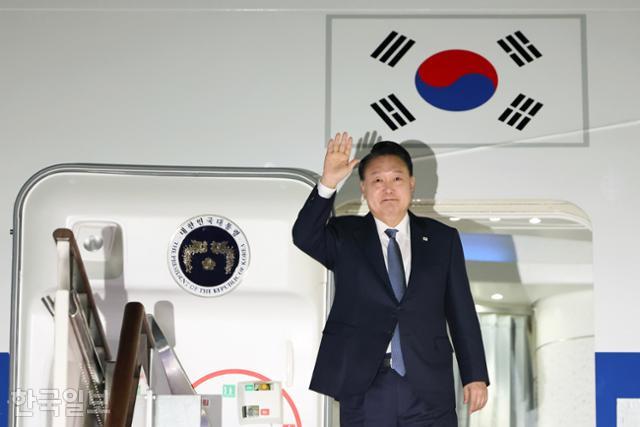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