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문학상 수상자 위수정 소설가
새해 추천 도서... 황현산 '밤이 선생이다'
파스칼 키냐르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

위수정 작가. 문학과지성사 제공
아름다운 글을 읽고 싶다. 아름다운 문장을. 요즘 특히나 ‘안구 정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일까. 최근 두 권의 책을 가까이에 두고 지냈다. 황현산 문학평론가의 ‘밤이 선생이다’와 소설가 파스칼 키냐르의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가 그것이다.
이 시기에 정확하게 마음을 감싸주는 글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는 출간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읽어도,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정확하게 마음을 감싸주는 글이다. ‘밤이 선생이다’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황 평론가가 쓴 산문집인데, 어떤 부분을 펼쳐 읽어도 일정하게 좋다. 감정이 요동칠 때 그의 글을 읽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안을 얻는다. 황 평론가의 글은 부드럽고 군더더기 없으며 세심하고 정갈하다. 어떤 책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다. 온전한 동의를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나 한편 조금 슬프기도 하다.

밤이 선생이다·황현산 지음·난다 발행·302쪽·1만6,000원
2013년에 황 평론가는 이렇게 썼다. “나도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했다. (…)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천 년 전에도, 수수만년 전에도, 사람들이 어두운 밤마다 꾸고 있었을 이 꿈을 아직도 우리가 안타깝게 꾸고 있다.” 이 꿈은 지금도 유효하다. 너무나 유효하다. 그러므로 때로는 절망 안에 침잠하기도 하지만 이 꿈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만두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소중하다.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공간으로 이끄는 글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파스칼 키냐르·프란츠 발행·224쪽·1만7,800원
키냐르의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에도 ‘그만두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밤이 선생이다’와는 대조적으로, 내가 처한 세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공간으로 나를 이끈다. 형식 역시 낯설다. 희곡의 형식을 취하나 소설 같기도, 시 같기도 하다. 키냐르는 겨울이 되면 계절성 우울증에 빠지고 그 긴긴 겨울밤을 견디려 ‘시미언 피즈 체니’라는, 최초로 새소리를 기보한 19세기 가톨릭 사제에 대한 글을 쓰기로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이다.
제목은 무척 낭만적이지만 내용은 그렇지만은 않다. 키냐르가 재구성한 시미즈는, 딸을 낳고 죽은 아내만을 집착적으로 욕망하는 남자다. 부녀의 불화는 시대착오적이라 읽다 보면 불편한 감정이 피어오른다. 그럼에도 마음을 끄는 묘한 구석이 있다. 19세기 미국의 정원 풍경과, 낯선 식물들의 이름과,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끈질기게 사랑하고 욕망하며 늙어가는 한 남자의 마음이 나의 어떤 곳과 접속하는 것일까.
길고 혹독한 겨울밤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글을 쓰는 작가의 뒷모습이 읽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눈앞에 떠오르는 정원의 풍경과 소리들. 아내가 가꾸던 정원을 돌보며 ‘음악 이전의 음악’을 채보하는 남자의 삶. 그는 자신이 그린 악보를 출판사에 보내지만 매번 거절당한다. 그의 곁에는 딸이 있다. 둘의 대화는 불안하고 불편하며 고독하다. 작품 안에서 그들은 빠르게 늙어간다. 모두가 속절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향한다. 예외는 없다. 너도 나도. 그렇대도 우리는 무언가를 꿈꾼다. 의지를 가지려고 애쓴다. 결국 그만두지 못한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게 세계의 진실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그것이 더 아름답다고.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만두지 못한다. 이제는 인정하자. 그러고 보면 나를 키운 것은 결국 책이었고, 밤이었나 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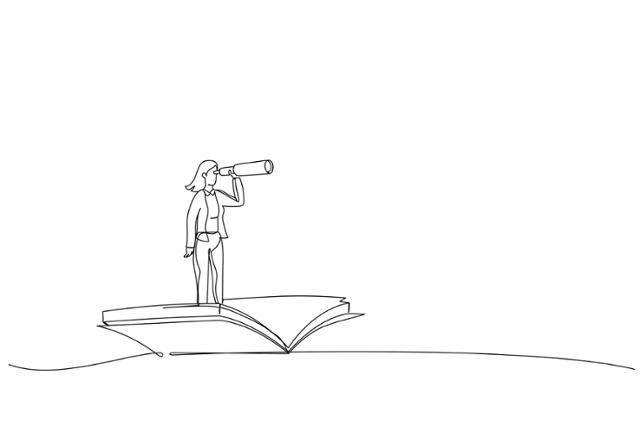




댓글0